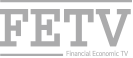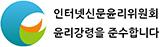[푸드경제TV 정시우 칼럼니스트]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 (소설 ‘남한산성’, 김훈)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임금 인조는 삼전도로 나아가 오랑캐 앞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다. ‘삼전도의 굴욕’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치욕스러운 날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남한산성’이다. 영웅의 서사에서 완전히 비껴가 있는 ‘남한산성’은 분명 상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명백하게 지는 싸움. 그런 서사를 영화는 별다른 기교 없이 묵묵히 따라간다. 역설적이게도 이 기교 없음이 ‘남한산성’을 여타의 영화들과 차별화시키는 힘이다.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살 것인가” 척화론자 김상헌(김윤식)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게 명분 없는 삶이란 곧 죽음이다. 주화론자 최명길(이병헌)은 잠시 치욕적이라도 목숨을 지켜 후일을 도모하자고 말한다. 그는 삶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고 믿는다.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두 사람의 대립을 통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처음 보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를 묻는 듯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좌’나 ‘우’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삶의 다양한 태도들에 대한 질문임을 알 수 있다.
부제로 ‘혀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적합해 보이는 영화에서 인물들은 칼 대신 각자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싸운다. 호흡이 느리게 진행되는 탓에 지루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지만, 이를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가 방어해낸다. 김윤식과 이병헌이 말로 붙는 몇몇 장면에선 보이지 않는 불꽃이 터진다. 밀도가 상당하다. 문어체의 딱딱한 소설 속 대사들이 두 배우를 통과하며 생동감을 입었다.
‘최명길’과 ‘김상헌’ 논쟁 외에도 영화에는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가마니를 장병들의 추위를 막는데 쓸 것인가, 굶어 죽어가는 말의 먹이로 쓸 것인가. 청에 서신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오랑캐에 짓밟히고 있는 장병들에게 퇴각을 명령할 것인가, 장병을 더 보내 싸울 것인가. 영화는 선택의 순간 앞으로 여러 번 관객을 실어 나른다. 삶이 되고, 그것이 결국 역사가 되는 선택들이다.
아쉬움이 없는 영화는 아니다. 고수가 연기한 서날쇠로 대변되는 민초의 이야기가 ‘김상헌 VS 최명길’ 대결에 비해 밋밋한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캐릭터로만 놓고 보면 서날쇠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용맹하다. 영화 안에서 가장 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매력이 이상하리만치 평면적으로 다가온다. 연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의 문제일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서날쇠 캐릭터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정치 싸움에 병드는 민초들의 삶이 보다 밀도감 있게 다가왔을 것이란 점이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챕터 역시 그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인상이 있다. 챕터를 통해 소설의 방대함을 효과적으로 줄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친절한 화법이란 점에서 실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남한산성’은 원작을 둔 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대체적으로 잘 살핀 결과물이다. 원작이 품은 메시지를 이토록 꼼꼼하게 영화에 눌러 담은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인데, 덕분에 소설이 그렇듯 영화에도 오늘의 정치가 두텁게 겹쳐 보인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와 그 안에서 반목하는 위정자들. ‘남한산성’은 어쩌면 현재진행형인 역사인지도 모른다.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생각의 꼬리가 길게 남는 건 그 때문인지도. 김훈의 말을 다시 떠올려본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
정시우 칼럼니스트 siwoorain@hanmail.net